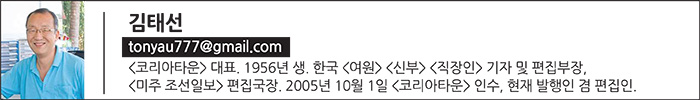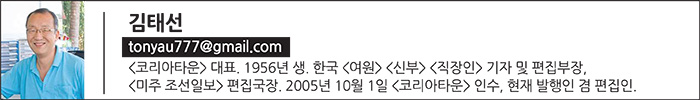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안녕하세요? 정길남입니다!” “차장님!” “정길남!” 2010년 크리스마스 아침, 두 남자는 그렇게 눈 덮인 명동성당
앞에서 반갑게 얼싸 안았습니다. 언제 만나도 씩씩하고 유쾌했던 그는 1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한 ‘훈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생활을 접고 맞춤정장 전문기업 CEO로 변신했던 그는 믿었던 후배 하나가 회사 돈 5억원을 갖고 해외로 도망가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라며 유쾌하게
웃던 그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사업아이템을 개발, 새로운 출발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목동에서 그 프랜차이즈점을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오시면 꼭 옷 한 벌 해드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제 몸에 줄자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멋진 정장 한 벌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흰색과 보라색 셔츠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넥타이 몇 개, 심지어 나비넥타이, 정장 윗주머니에 꽂는 행커치프 등을 들고 몇 차례 더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다시 저를 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명동 한 복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맥주잔을 부딪치며 옛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차장님은 기자들한테는 참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제가 사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간섭, 광고부나
영업부, 관리부 사람들의 쓸데 없는 참견을 다 막아줘서 참 편안하게 취재하고 글 쓰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차장데스크 시절, 그는 수석기자였습니다. “정길남, 오늘 2차 마감인데 이 정도 기사량 갖고 마감 제대로 되겠어?” 평소 반말을 쓰지 않던 저의 나직한 이 한 마디에 그는 곧 바로 편집국 안에 ‘해골바가지’ 그림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만족할 만큼’의 기사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녀 불문, 기자들 모두가
편집국에서 밤을 새웠던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기자들은 양질의 기사를 데드라인에 맞춰 내기만 하면 된다.” 제가
기자들을 관리하는 원칙이자 기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기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은 아세요? 저희는 차장님이 요구하시는 ‘양질의 기사’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차장님은
분명 기자들에게 천사 같은 분이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나 용서도 없으셨습니다. 차장님의
그러한 엄격한 잣대 덕분에 차장님과 일하던 기자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쓴 기사가 온통 차장님의 빨간 글씨에 뒤덮여 돌아 왔을 때의 허무함이란….” 몇 번을 만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길남입니다!” 요즘도 그는 가끔씩 뜬금없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유쾌한 목소리는 문득 한국 생각, 여기저기를
빨빨거리며(?) 뛰어다니던 옛날 생각,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던 그들과의 술자리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냥 명동에서 여럿이 맥주 한 잔 하다가 사장님, 아니 차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조금은 취기가 깃들어진 그의 목소리는 비라도 오는 날이면 왠지 끈적끈적(?)
느껴지기도 합니다. ********************************************************************** 김태선 <코리아 타운> 대표.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