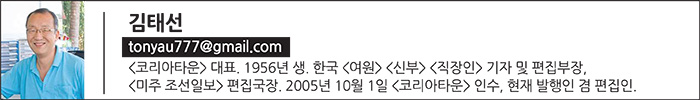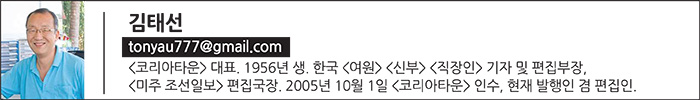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일주일 앞만 보고 사십시오!” 제가 시드니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게 2001년
9월 13일이었으니
이제 만으로 6년이 돼 갑니다. 911 테러가 난 다음 날 저녁, 탑승 취소가 빗발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용감하게(?) 시드니 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도착한 동네가 캠시 (Campsie). 마치 시골 읍내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함
가운데에서 여유로움 같은 게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교민매체의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곧 바로 일을 시작하고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와 호락호락한 이민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그건 참으로 묘한 명제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시드니가 이제는 아주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동네’로 다가옵니다. 거리의 표지판들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쓰여진 시청 앞, 무역센터, 압구정동… 하는 식의 그것들처럼 너무너무 친숙합니다. 꼭 영어를 써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아예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어리버리하게 이민생활을 시작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지인의 이 이야기가 지금도 제 뇌리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김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초기
이민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일 년 앞, 아니 한 달, 두 달 앞만 생각해도 답답해집니다. 호주는 모든 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우선은 일주일 앞만 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제 후배 가족이 1년 8개월여 동안의 시드니 생활을 접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냥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게 역(逆) 이민을 결정한 후배 가족의 변(辯)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드니에 오기 전, 비자문제에서부터 집 구하기까지의 많은 것들을
챙겼고 서울로 돌아가는 뒷마무리 또한 열심히 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혹시 지금 낯선 땅 시드니에서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초기 이민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일 년 앞, 아니 한 달, 두
달 앞만 생각해도 답답해집니다. 호주는 모든 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우선은 일주일 앞만 보고 사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 김태선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