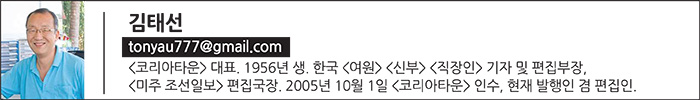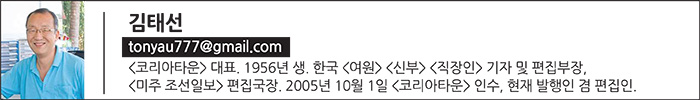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에이, 설마…”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 일곱 시가
최종마감입니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사람은 본인 꼭지를 다 마칠 때까지 퇴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기자들은 없었습니다. 이전의 데스크들이 모두 말로만 엄포를(?)
놨을 뿐 하루 정도는 최종마감을 늦춰줬는데, 더군다나 다른 회사에서 옮겨온 지 얼마 안된
신임차장이 말만 저렇게 하겠지, 설마 밤이야 새겠어? 자기는
뭐 퇴근 안 할 건가? 다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드라인 (deadline)까지
자신의 기사를 마감하지 못한 열댓 명의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되는 기사는 곧바로 나한테 가져와요. 종혁씨는 기자들
저녁 뭐 먹을 건지 물어서 만리장성에 주문해요. 오늘은 술도 요리도 안 됩니다.” 이 한 마디를 던져놓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데드라인을 지킨 예닐곱 명의 기자들도 쭈뼛쭈뼛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고 남을 수밖에 없는 기자들은 삼삼오오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두들
제 자리로 돌아가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마감을 지킨 기자들은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녁식사가
배달돼오자 각자 짜장면이나 짬뽕, 또는 볶음밥을 자기 책상에 놓고 한 입 먹고 기사 한 줄 쓰고… 열심입니다. 1, 2, 3차 마감을 위해 야근할 때는 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며 얘기도 하고 술도
몇 잔씩 하곤 했는데 이날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평소 친근한 형,
오빠, 천사(?) 같았던 차장이 1백 80도 악마로 싸늘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사마감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편집국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럼 수로씨는 강남, 분당, 용인 쪽을 맡고 동건씨는 신촌, 화곡동, 목동 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민종씨는 상계동, 수유동 쪽을 들러줘요. 수원, 인천, 김포, 일산 쪽은
내가 맡을 게요.” 이미 밤 열두 시를 훌쩍 넘겨 새벽으로 향하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갖고 있는 남자기자들에게 지역을 배정하고 개개인이 확실히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기름값은
부서운영비에서 챙겨줍니다. “모두들 고생했어요. 내일 아침
출근은, 내가 책임질 테니 푹 자고 오전 열한 시까지 출근하는 걸로 합시다. 자, 출발!” 이렇게 한 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데드라인을 어기는 기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스크 시절, 저는 기자들에게 ‘데드라인 엄수’와 ‘양질의
기사’를 강조했고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악마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를 철저히 지킨 기자들은 훗날 어디에서든 제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지금 <코리아 타운> 가족들에게 이와 비슷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됐든 광고가 됐든 ‘마감시간 엄수’를 주문합니다. 광고에 관한 한 컨셉에서부터 카피라이팅, 디자인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타운>은 목요일, 마감날에도 밤늦게까지 또는 열두 시를 넘겨가며 일하는
경우가 없고 좋은 기사, 좋은 카피를 위해 토씨 하나를 놓고도 고민을 거듭합니다.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좋은 매체, 이것이 <코리아 타운>이 반드시 지키려 하는 절대명제이고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김태선 <코리아 타운> 대표.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