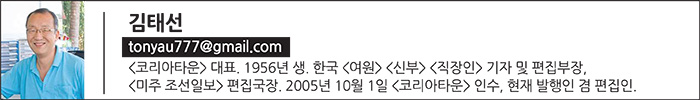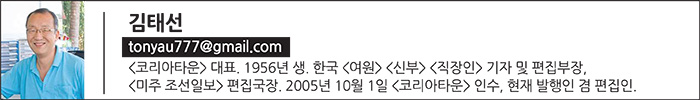한밤의 팥빙수 “아빠, 뭐해?” 딸아이는 가끔씩 우리에게 뜬금없는(?) 카톡을 날리는데 그날도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 아내와 저는 조금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맵싸하면서도
맛있게 양념된 돼지껍데기가 식탁에 올라왔기에 “우리 술 한잔 어때?”
했는데 그게 작은 술판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스키 네 잔째를 마시고 있는데
딸아이에게서 카톡이 날아든 겁니다. “오빠가 팥빙수 먹으러
스트라 가재.” 밤 아홉 시에 저녁식사를 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그 시간에 팥빙수를 찾아 스트라스필드라니…. 하긴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문득 뭔가를 시작하거나 갑자기 어디론가로 떠나는 걸 즐겨 했으니 딸아이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터입니다. 게다가 딸아이 신랑도
이 같은 우리와 코드가 꽤 비슷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도 문득 그렇게 어디론가를 다녀오길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줍니다. “아니, 너희끼리 갔다 와. 난 술 마셔서 운전 못해.” 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 딸아이 신랑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자기네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딸아이 부부 덕분이었습니다. 밤 열 시가 다 돼가는
시간, 우리는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커다란 팥빙수 그릇과 마주했고 오랜만에 먹는 팥빙수는 그 시원함과
달콤함을 훨씬 더해줬습니다. 제 무릎에 앉은 우리의
미소천사 에이든은 팥빙수가 제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숟가락에서 눈을 못 뗀 채 앙증맞은 입으로 입맛을 다십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저놈도 먹겠다고 숟가락을 갖고 달려들 참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광장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이든을 안고 여기저기를 거닐었습니다. 조금은 분위기 있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시끄러울 정도로 합창을
계속하는 앵무새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과 즐거움입니다. 에이든은 제 품에
안겨 여기저기를 신기하다는 듯 쉴새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광고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오색 불빛이 보여 그곳을 가리키며 “아, 예쁘다!” 했더니 녀석이 입을 함박만큼 벌리며 크게 웃습니다. 에이든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 없이 웃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크게 소리를 내며 까르르 웃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녀석을 안고 우리 집 뒷마당에 나갔다가 커다란
민들레가 있길래 “에잇! 에잇!” 하며 발로 툭툭 찼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들을 보고
에이든은 까르르 까르르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카페
안의 딸아이 부부와 아내의 모습이 참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딸아이 부부는 그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치킨 한 마리와 순대, 떡볶이 그리고 생맥주까지 한잔씩 했습니다. 저녁
배불리 먹어놓고 밤 열한 시가 넘은 시간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찐다고 손사래를
쳤을 딸아이와 아내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제법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지인 몇몇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손주? 벌써? 녀석, 예쁘게 생겼네!” 마음
같아서는 “손주라니, 조카예요! 조카!” 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이들처럼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입에 물고 밤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행복은 그 크기와 모습이
아주 거대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태선 <코리아타운> 대표.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