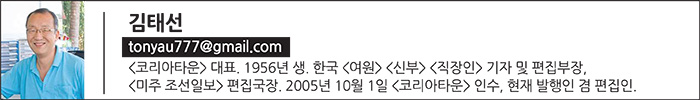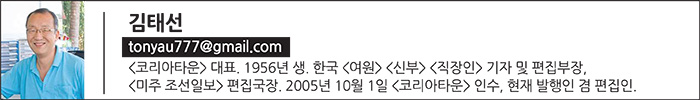한 문제라도 틀리면 억울해 하던 아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 시험시작 직전까지도 노트나 책에서 손을 떼지 않고 하나라도 더 외우려 기를 씁니다. 시험종료 벨이 울려도 시험지를 걷어가는 순간까지 시험지를 놓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겨우 한 두 개 틀린 걸 가지고 마치 시험을 완전히 망쳐 버린 것처럼 오버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재수 없는’ 친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랬습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게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비단
시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해결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들을 나름 ‘티 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재수 없다’는
말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처음 해본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등수를 매기는 건 교육 상 좋지 않다’는 원칙 때문에 등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의 어머님이 ‘전교 1등짜리 엄마’라고
주목 받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늘 1, 2등을 다투는 친구들
속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버릇은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여서, 잘 안 풀리는 기사를 붙들고
끙끙대다 보면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 있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코피가 주르르 흐르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 하자는 생각이 늘 있어서 저는 뭘 하든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편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많이 듣지만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데는 제 자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광고카피 한 줄을 만들어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는 엄청 지우고 고치기를 반복합니다. 외부 원고를 받아도 절대로 그냥 싣는 법이 없습니다. 헤드라인이나
중간제목은 꼭 바꾸거나 만들어 달고, 문장 내의 덜 매끄러운 부분도 반드시 손을 봅니다. “일주일 보고 버리는 책, 뭣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한 주 한 주 나오는 <코리아 타운>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쩌다가 작은 실수라도 나거나 인쇄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학창시절 시험문제 한 개가 틀려 안타까워 하던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코리아 타운>은
많은 분들로부터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새해에는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고민하려 합니다. 학창시절,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악착 같이 공부하던 그런
마음으로 새해에도 더 좋은 <코리아 타운>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
2008년을 기원하겠습니다. ********************************************************************** 김태선 1956년 생. <코리아 타운> 대표.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