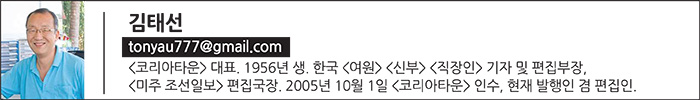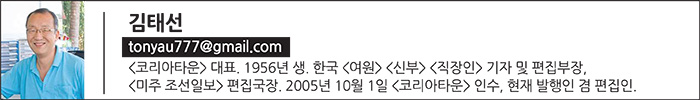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김 사장님 끝까지 모르는 척 하려 했습니다” “어? 원장님!” “…” “원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
동안 잘 지내셨죠?” “…”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인사를 했지만, 2년여 만에 만난 그 사람은 정작
멀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예 외면을 하다가
마지 못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김 사장님 끝까지 모르는 척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대략 이러 했습니다. 그 동안 이스트우드에서 저를 세 번 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못 본 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아, 저
사람이 코리아 타운을 인수하고 잘 나가니까 나를 모르는 체 하는구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그 날 처음 마주쳤고 그 사람이
말한 그 동안의 세 번은 그 사람은 저를 봤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해가 풀렸지만 “다시는 김 사장님이랑은 아는 체 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세월 기자생활을 하면서 사람 이름과 얼굴 기억하는 일, 그리고 주소
하나 들고 집 찾는 일에는 이력이 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크게 줄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소 길을 걸을 때면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 요인도 있었을 듯싶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을 보고도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성격은 결코 아니니 혹시라도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생긴 현상 중 하나가 ‘얼굴 따로 이름 따로’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만 솔직히 “누구지?”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한동안은 그냥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지만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 번 알려 주시면
이제부터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 해주면 옛날 실력 (?)을
발휘해 상대에 대한 기억을 정확히 담아 두려 애씁니다. 상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열심히 입력 해둡니다.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사람에 대한 기억, 사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 김태선 <코리아 타운> 대표.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