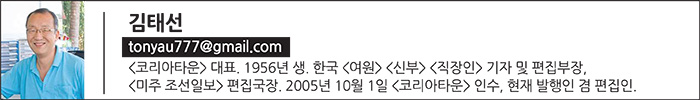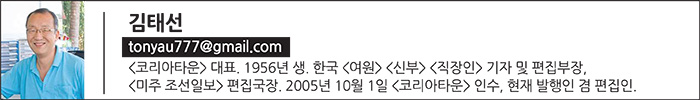이 부장 바가지 씌우기 대작전 “내가 ‘희생 플라이’ 한 번
칠 테니까 다들 자기역할 놓치지 말고 오늘 밤, 이규환
부장 확실히 보내자구!” 동료 악동(?) 여섯과 이렇게 작당을 했고, 그날 밤 우리는 명동의 한 부대찌개 집에 모였습니다. 멋 모르는
이 부장은 그날도 ‘날로 먹기 위해’ 우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특수사업부 이규환 부장. 그는 돈도 많은 사람이 치사하리 만치 쩨쩨하게 굴어 늘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곤 했습니다. 여럿이 뭘 먹으러 가도 그는 절대로 돈을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부장이 돈을 안 내기 위해 쓰는 방법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당당하게(?) 크레딧 카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이었으니 당시에는 크레딧 카드가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가맹점 또한 상당히 적었습니다. “어? 카드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내려 했는데…” 어리둥절해 하는 왕대포집 아줌마 앞에서 그는 그렇게 빠져 나가곤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방법은 역시 포장마차나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3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당시
가계수표는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사용이 매우 제한되고 까다로웠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받는 포장마차도 있던데….” 이 부장의 마지막 방법은 거의 술판이 끝나갈 무렵 “나, 차 좀 빼놓고 올 게” 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곧 돌아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몇 차례 당하고 나서는 이 또한 그의 돈 안 내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크락션을
울리며 “아, 안 갈 거야?”
하고 외치는 데는 당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뺀질 대는 이규환 부장을 노리는(?) 사람들은 곳곳에 많았고 그날 밤 우리가 그 총대를 멨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은 김태선
기자가 쏜답니다. 실컷 먹고 한 번 뒤집어져 보자구요!” “어, 그래? 김 기자,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 오늘 제가 술이 몹시 땡겨서요… 가시죠. 이 부장님.” 우리는 부대찌개 두 개를 시켜놓고 소주를 원샷으로 끊임 없이 부어댔습니다. 중간중간
이규환 부장한테 덫 놓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 2차는
이 부장님이 쏘시죠. 전부터 술 한 번 사겠다 그러셨는데 오늘 한 번 땡기세요. 박봉의 김 기자가 1차를 쐈으니
2차는 우리 멋쟁이 이 부장님이 한 번… 자, 우리
멋진 이 부장님을 위하여!” 마지막 덫을 맡은 박 기자가 멋지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 나 카드밖에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이 부장님. 제가 카드 되는 아주 좋은 집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그날 밤 우리는 명동 로얄호텔 맞은 편 최고급 술집에서 양주에 밴드까지 불러놓고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곧 부대찌개랑 쏘주 찐하게 또 한 번 쏘겠습니다.” “아니… 김
기자… 괜찮은데…” 크레딧 카드를 들고 있는 이규환 부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보며 우리 일곱 악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다 보면 지나치리 만치 돈을 안 내려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서로 내겠다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보기 좋은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습니다. 오늘은 문득 이규환 부장 생각이
났습니다. ********************************************************************** 김태선 1956년 생. <코리아 타운> 대표.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