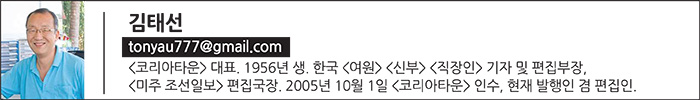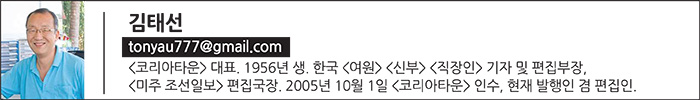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안녕하세요? 호주회계법인 배용준
회계사님!” “28번 홍광수, 37번 정민호, 조용히 해! 너희들 벌써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걸리면 오늘 화장실 청소당번 시킨다.” “13번 오주환, 너는 책상에 엎드려 있지 말고!” “45번 이부현, 이리 나와서 수학 19페이지 3번
문제 칠판에다 풀어봐.” 와글대던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장이 떠드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주의를 주자 처음엔 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용히 하라’고 외칠 때와는 크게 다른 결과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저는 얼떨결에(?)
반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고 키도 크고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에서 담임선생님이 반장을 맡겼던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45분 동안을 아침자습 시간으로 정해, 반장 주도 하에 자습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조용히
자습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글대는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반장이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겠어?”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대로 그림을
그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드는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지적하자 아이들은 뭔가 모를 압박감에 제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저희 반은 전교에서 가장 아침자습 상태가 좋은 학급이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사회생활에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 첫
날에는 으레 이런 행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함께 일하게 된 박신양씨입니다”로 시작해서 부서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지만, 솔직히 첫 출근한 당사자로서는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전, 함께 일하게 될 부서원들의 이름을 미리
머릿속에 담아 두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원 소개를 받을 때 제가 기억해둔 이름과 부서원들의 특성을
연결, 열심히 입력(?) 해둡니다. “…윤소희 기자는 집이 당산동이라 그랬죠? 그럼
출퇴근 때 올림픽대로 타겠네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김화영 기자는 고대 출신이라던데 막걸리 몇 통이나 마셔요? 김기욱 기자가 지난 번에 다뤘던 스타 100문 100답 최진실 편은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서 아주 재미 있더라구요…” 새로 출근한 차장이 기자들 이름 하나 하나를 정확히 짚어내며 이야기를 건네는 걸 보면서 그들은 짐짓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 저 사람, 오늘
첫 출근인데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네?” 훗날 친해진 뒤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저에게서 ‘놀라움 3, 친근감 7’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그냥 사장님보다는
스마일화장품 이영애 사장님이, 그냥
변호사님보다는 오지법무법인 차인표 변호사님이, 그리고 그냥 회계사님보다는 호주회계법인 배용준
회계사님이 더 정확하고 친근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김태선 1956년 생. <코리아 타운> 대표.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