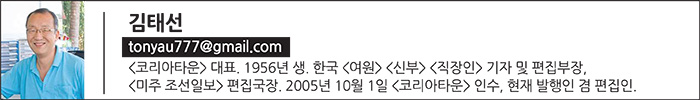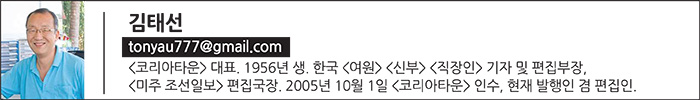반갑다, 연어야! 1년여만에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비치에 꽂혀있던 4미터 30짜리
낚싯대가 한껏 휘더니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잽싸게 달려가 낚아챈 후 놈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녀석이 우리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아내가
쏜살같이 낚싯대를 향해 내달았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연어를 끌어올리다가 막판에 놓쳤던 아내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윽고 조금 전 제가 잡은 것보다 덩치도 더 크고 훨씬 뚱뚱한 녀석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활짝 웃으며 하이 파이브를 했습니다. Australian Salmon… 맛도 없는 걸 뭐 하러 잡느냐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버티는 녀석과 ‘밀땅’을 하며 벌이는 비치에서의 한판승부(?)가 즐겁기만 합니다. 70센티미터 가까운 놈들과 한참 힘겨루기를 하다가 녀석들을 우리 앞에 끌어올려놨을
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는 다할 수 없습니다. “자기야, 내일 아침 일곱 시쯤에
물이 꽉 차는데 자기 안 피곤하면 아침 여섯 시쯤 출발해도 될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한 제안입니다. 그렇게 1년여만에 우리는 연어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그 동안 갈치와의 사랑에(?) 빠져
연어에는 통 관심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넓은 바다를 만나니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집에서 그곳까지 한 시간 이십분 정도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내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차창 밖으로 그림 같이 펼쳐지는 자연들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비치에는 벌써 스무 개가 넘는 낚싯대들이 꽂혀 있었고 아내와
저는 오른쪽 맨 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은 별로인데…”라고
생각하며 짐을 내리는 순간, 바로 옆 호주인이 던져놓은 낚싯대가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연어 한 마리를
끌어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잡았다는 건 물고기들이 있다는 뜻이었기에 우리는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마리째를 끌어올릴 무렵부터 우리의 낚싯대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약아 빠진 녀석들은 교묘하게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치기도 했고 좀더 심한
녀석들은 아예 낚시바늘은 물론 줄까지 통째로 끊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고기가 잘 안 나오는 요즘, 그날은
그 호주인과 우리만 연어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리를 파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억세게 운이 좋은 날이다”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 시간 정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만치 보이는 성산포를 닮은 섬(?)과 언덕 위 빨간
기와집, 그리고 등대에 시선을 자주 줬습니다. 그곳에서 먹는
컵라면과 삶은 계란, 그리고 커피 한 잔은 왜 그리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낚시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갈치낚시를 하는 곳이나 연어낚시를 하는
곳은 그냥 놀이터일 뿐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낚시는 낚시도 아니지만, 아내와 저는 그 속에서 늘 기쁨을 찾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는 언제나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있는 것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엔 1년여만에
다시 찾은 우리의 놀이터에서 그렇게 연어 두 마리와 엔돌핀 한 다발을 담아왔습니다. ********************************************************************** 김태선 <코리아 타운> 대표. 1956년 생. 한국 <여원> <신부> <직장인> 기자 및 편집부장,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 2005년 10월 1일 <코리아 타운> 인수, 현재 발행인 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