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오면 한국의 곱게 물든 단풍이 참 많이 그립다. 물러갈 것 같지 않던 여름이 환절기 시간의 흐름 앞에 아름답게 탈바꿈한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연분홍 고운 코스모스가 하늘을 향해 그리움을 전하면 괜스레 마음이 설렌다. 타향살이가 길었나 보다 고향 바라기를 한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마음 열고 친분을 쌓아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로 가슴 조이는 외로움에 목말라하면서 마음엔 빗장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다. 어인 상처가 그리도 많은지, 대화가 깊어져 지난날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눈물이 맺히고 목이 멘다. 저마다 안고 사는 몇 개쯤의 애환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간다. 어디에 풀어 놓겠는가. 모두 내 아픔이 크다는 아집을 보물인 양 안고 살아가는데.
마음 맞는 사람과 차 한 잔 나누며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다. 종교를 찾고 친목 활동을 하며 뜻이 같은 친구를 찾아보지만, 또한 만만치 않다. 용기를 내어 취미 활동이라도 가보면, 어느새 고령이 된 듯한 내 모습에 주눅이 든다. 앉아있기에 괜스레 면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나만의 자존감인지. 나이가 들었음을 확인 받는 자리 같아 우울함이 온다.
우연한 기회에 시드니 교민잡지를 읽다가 ‘문화원’이라는 광고를 보았다. 나이 제한은 없는데 연세 높은 분들이 많다고 한다. ‘연세 높은 분들’이란 말에 솔깃하여 찾아갔다. 예상대로 머리 희끗희끗한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 위엔 차와 커피 그리고 두어 가지 빵과 과자가 준비되어 있다. 도서실 사용료 겸 회비를 내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 의자에 앉았다.
화면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역사 공부가 있는 날’이라고 쓰여 있다. 역사 공부에 흥미가 없어 일찍이 태, 정, 태, 세, 문, 단, 세…로 접고 있는 내 모습이 송구스러웠다.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부모님 연배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 겸연쩍어 맨 뒷줄에 앉았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연소자로 송구스럽다. 이 나이는 앞에서 미안하고 뒤로 송구스러운 영락없는 낀 세대의 표상인가 보다. 어디 앉아야 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개를 드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세월의 흔적이듯 하얗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두서없이 흩어져 있다. 주변머리와 귀 위, 아래로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나이를 실감하게 한다. 타향의 녹록지 않은 삶의 바다를 건너와 노인이 되어버린 이민사의 실세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
교수님 강의에 귀를 세우고 역사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에 빠져든다. 질문하고 대답을 하며 시간이 무르익을 즈음 점심시간이 되었다. 간단하게 가져온 도시락을 펼쳐 놓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며 대화의 꽃을 피운다. 마치 유치원의 한 모습 같아 정겨워 보인다. 맑은 표정이 지난날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듯 사랑스럽다. ‘내 나이가 어때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분위기이다. 역시 나는 역사 공부는 아니다.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가 들리며 사랑방 같은 강의실에 2부가 시작된다. 뮤지컬 여배우’ 디아나 더빈’의 노래와 역사로 이어간다. 사실 디아나 더빈을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 아는 노래들이 꽤 있어 흥미로웠다. 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디아나 더빈은 캐나다 출생으로 영화배우 겸 뮤지컬 배우이다. 배우의 어린 시절부터 인기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한다.
귀에 익은 노래가 흐르면 몸도 마음도 흔들흔들 리듬을 타며 적어도 순간만큼은 젊음이다. 함께 부르기에서, 데니 보이, 메기의 추억 등의 노래를 합창한다. 데니 보이를 부르는데 갑자기 목이 메며 주책같이 눈물이 흐른다. 구부러진 허리에 하얀 머리카락을이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가슴 먹먹하게 한다. 어쩌면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듯, 자식을 그리워함일까. 먼산바라기로 시선을 허공에 띄우고 입만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애잔한 그리움이 잦아든다.
‘옛날에 금잔디’ 잔잔한 합창 소리에 고단함이 녹아 내린다. ‘일 트로바토레,’ ‘라 보엠’등 짧게 오페라의 중요한 부분도 감상한다. 그래, 이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하얀 머리가 되기까지 어느 알 수 없는 질풍노도와 같은 세월을 달려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노랫말이 내 삶의 일부인 듯한 공감이 느껴질 때 가슴 먹먹하고 목이 잠긴다. 나 역시 질금거리는 눈물을 훔치며 안경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가을 하늘 아래 반짝이며 흐르는 산골짜기 물소리 같은 시간이 무르익어간다. 맑고 청아한 모습은 청춘을 사르며 사계절을 벗 삼아 건너온 세월을 보는 듯하다. 하얀 머리의 세월 앞에 자꾸 눈물이 흐른다. 머지않아 나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내 모습 같은 사람들 앞에 앉아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 없는 헐벗은 내 모습이 허수아비처럼 비추어진다. 우아하게, 멋지게 살라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를 만들어 단아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다가올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더욱 정겨운 오렌지 빚 노을이지 않을까. 자주 찾아 인생의 선배님이자 이민사회의 선배님들에게 어리광도 이야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순리도 배우고 싶다. 아니 좀 더 솔직하여지자면 자신이 없다. 말없이 풍기는 중후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버린 중년의 자존심이 발길을 망설이게 한다. 진정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다.
호주의 여러 곳을 견학하고, 해외여행도 무리 없이 다녀온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아낌없는 희생과 책임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거다. 고단한 이민 사회에 연세 드신 분들의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같은 멋진 공간이 부럽기만 하다. 진정 삶의 멋을 알고 즐기는 분들의 사랑방에, 열린 마음을 함께 나누는 행복이 있지 않을까. 가을 산을 곱게 물들이는 단풍처럼 오래도록 지속하여 젊은이들의 귀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슴은 저며 오지만, 함께한 시간이 주는 커다란 여운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훈기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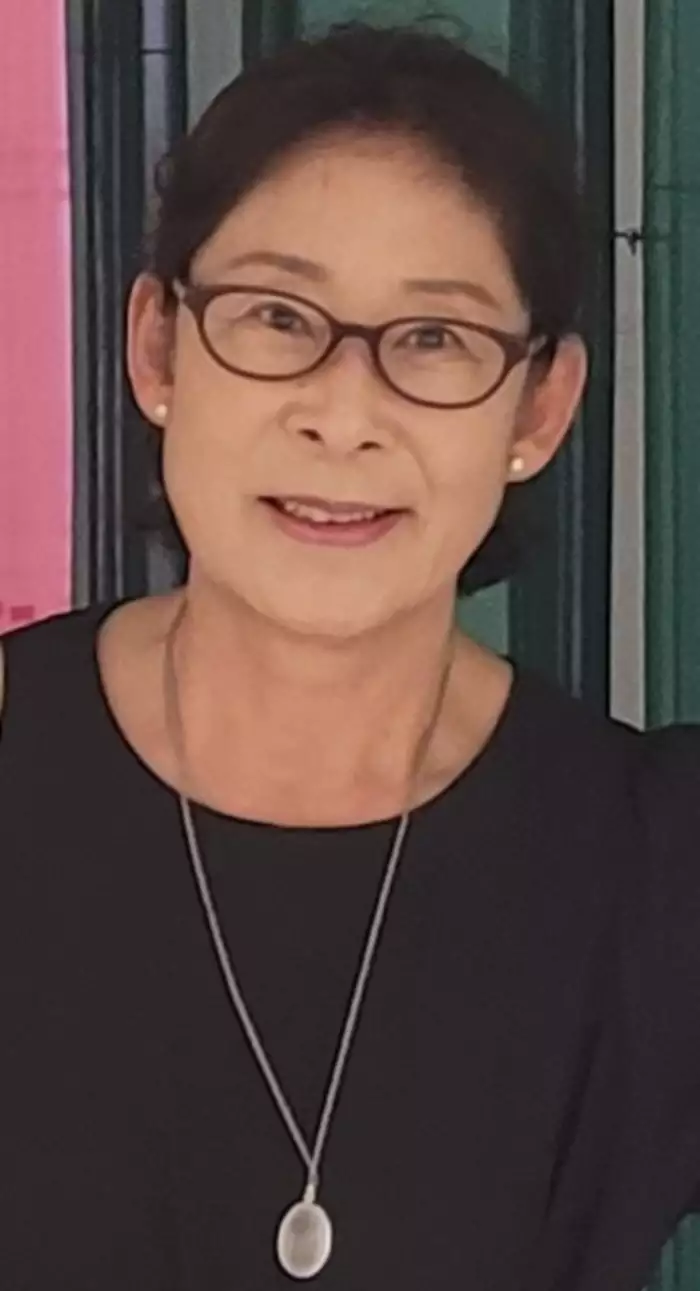 글 / 전정민 (동그라미문학회 회원·창작산맥 수필부문 신인상)
글 / 전정민 (동그라미문학회 회원·창작산맥 수필부문 신인상)



